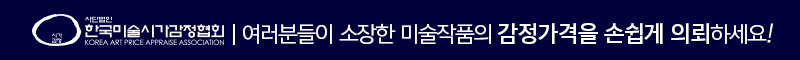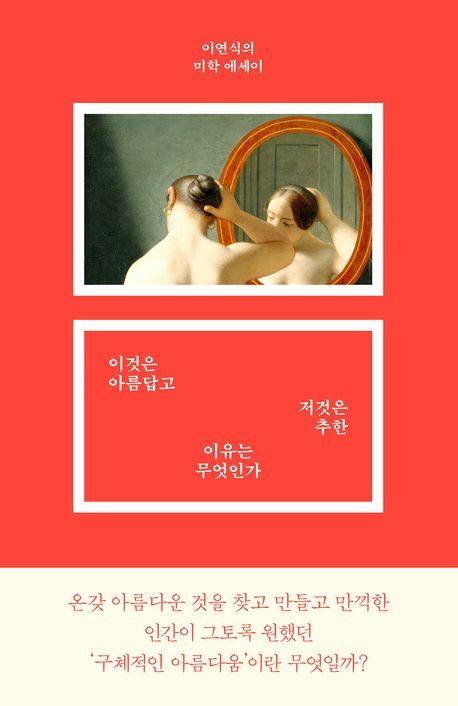악마에서 집사의 주인이 되기까지…'고양이 미술관'
등록 2025-11-30 02:02:00수정 2025-11-30 06:06:24
 |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우리는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 부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고양이가 주인을 반려해주는 것에 가까운, 그 일방적 관계의 미학을 탐구하는 책이 나왔다.
프랑스 공인 문화해설사이자 열네 살 고양이의 집사인 박송이 작가의 신간 '고양이 미술관'(빅피시) 은, 인류가 고양이를 어떻게 ‘오해하고 또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미술사를 통해 추적한 고양이 미학 입문서다.
◆악마에서 귀족, 그리고 ‘집사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중세 유럽에서 고양이는 오랫동안 악마의 화신이자 불운의 징표였다. 흑사병의 화살이 쥐가 아닌 고양이에게 돌아갔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이후 동물학이 발달하면서 고양이는 ‘작고 귀여운 동물’로 재해석됐고, 17세기에 이르러 귀족 초상화 속에서 품격과 여유의 상징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세기에는 영국 화가 루이스 웨인이 고양이를 캐릭터화하며 ‘친근하고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시선을 바꾼다.
결국 고양이는 인간을 향해 단 한 번도 태도를 바꾼 적 없지만-인간은 시대마다 고양이의 의미를 바꿔왔다.
◆“고양이는 삶을 예술로 만든다”
책은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됐다.
1부: 고양이를 새로운 존재로 그려낸 화가들, 2부: 인간과 친구가 된 고양이들의 장면, 3부: 느긋함, 독립성, 무심함, 고양이 고유의 세계, 4부: 일상을 채우는 고양이와 인간의 장면들.
루브르·오르세 등에서 활동한 저자의 해설은 단순히 ‘예쁜 명화 소개’에 머물지 않는다.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를 미술 언어로 해석해, ‘왜 우리가 고양이에 마음을 빼앗겼는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한다.
◆인간에게 고양이가 필요한 이유
책의 문장들은 때때로 철학적이다.
“고양이는 인간을 위로할 생각이 없다. 다만 그 곁에 있을 뿐이다.”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한 곁붙음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관계다.
고단한 하루 끝, 말없이 다가와 몸을 동그랗게 말고 눕는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고양이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고양이를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고양이 미술관'은 고양이와 함께 살았던 모든 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따뜻함을 그림으로 다시 기억하게 하는 책이다.
명화 속 고양이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는다.
그림 속 고양이도, 내 곁의 고양이도 결국 같은 방식으로 나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