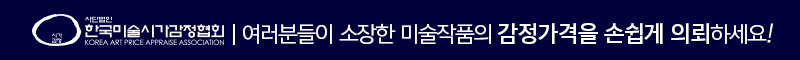달리는 인간, 김아영 ‘딜리버리 댄서’[박현주 아트에세이 ④]
등록 2025-11-15 01:01:00수정 2025-11-15 05:58:24
 |
| 김아영,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 2024, 영상 스틸. ACC 제작지원. 작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세상은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휴대폰의 진동처럼, 도시의 심장은 쉴 틈 없이 뛰고, 인간의 몸은 그 속도에 몸을 맡긴다.
그러다 어느새, 우리는 기계의 일부가 된다.
미디어아티스트 김아영의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팬데믹 시기, 그녀는 실제 배달노동자들을 따라 달리며 ‘움직임’ 속에 숨은 인간의 존엄을 기록했다.
그 질주는 단순한 생계의 몸부림이 아니었다.
삶을 이어가는 가장 원초적 형태의 몸의 언어였다.
‘딜리버리 댄서’ 3부작은 AI와 게임엔진, 실사 촬영이 교차하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해졌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 안에서 김아영이 진짜로 붙잡은 건 기술이 아니다.
데이터의 속도 속에서도 여전히 느끼는 존재, ‘생각하는 인간’을 다시 꺼내 보인다.
그녀의 인물들은 말 대신 움직인다.
말이 사라진 자리에, 몸이 생각한다.
그들의 몸짓은 언어보다 진실하고, 침묵은 차가운 고립이 아니라 서로를 감싸는 연대다.
스크린 속에서 여성들은 달리고, 흔들리고, 사라지지만 그 궤적은 곧 우리 모두의 초상처럼 남는다.
김아영은 기계의 시선으로 인간의 감정을 다시 번역한다.
냉철한 기술의 문법 속에서 온기를 만들어내는 일, 그것이 그녀의 예술이다.
AI의 계산 너머에 남은 불완전한 감정.
바로 그 불완전함이, 인간이 아직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
‘딜리버리 댄서’는 도시에 던진 질문을 확장하며 인간의 미래를 묻는 하나의 언어로 진화하고 있다.
도시는 오늘도 달리고 있다.
AI가 명령을 내리고, 인간이 속도를 맞춘다.
그 속에서 김아영은 묻는다.
“우리는 어디로 배달되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가 향하는 곳은 또 다른 인간의 심장일지도 모른다.
 |
| 김아영 작가 〈딜리버리 댄서의 구〉 *재판매 및 DB 금지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