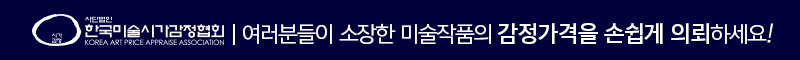빨간 새와 함께, 노은님의 빛 [박현주 아트에세이 ①]
등록 2025-11-01 01:01:00수정 2025-11-01 05:40:24
 |
| [사진=박현주 미술전문기자] 현대화랑에 전시된 노은님 '빨간 새와 함께' 1986년.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빨간 새가 사람을 감싸 안고 있다.
새의 몸이 사람의 몸처럼 보이고, 사람의 어깨가 새의 날개처럼 번진다.
둘의 경계는 흐려지고, 색은 서로를 품는다.
빨강과 검정이 섞이는 그 자리에서, 노은님의 세계가 태어난다.
1970년 독일로 건너간 노은님(1946~2022)은 평생 그렇게 ‘경계 없는 삶’을 그려왔다.
스물세 살 파독 간호보조원으로 시작한 그의 인생은 붓을 잡는 순간 달라졌다.
병원 회의실에서 우연히 열린 한 번의 개인전이, 함부르크 국립조형예술대의 문을 열었다.
백남준과 요제프 보이스가 먼저 그를 알아봤다.
“세상에 없던 그림을 그리는 여자”로 불린 노은님은 독일에서 교수로, 그리고 작가로 자신의 세계를 세웠다.
새, 고양이, 물고기, 오리, 호랑이… 그의 그림은 단순하지만 원시적 본능의 힘으로 가득하다.
검은 바탕 위에 번지는 붉은 물감, 단 한 번의 붓질로 태어난 생명체들.
그것은 회화라기보다 ‘살아 있는 호흡’에 가깝다.
“그림의 찢어진 부분은 살아 있다는 증거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딨나. 괴로워야 인생이다.”
노은님은 삶을 그렇게 말했다.
화려한 이력보다 그 문장 한 줄이 그의 예술을 설명한다.
찢긴 화면조차도, 그에겐 살아 있는 피부였다.
그의 작품 속 새는 영혼의 표정이고, 물고기는 기억의 흔적이다.
화면의 붉은색은 피가 아니라 빛이었다.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표현주의가 교차하는 그의 회화는, 고요하지만 격렬한 내면의 일기다.
그림은 그에게 ‘살아내는 일’이었다.
파독의 외로움, 타국의 언어, 상실과 치유의 시간들 속에서 그는 그렸다.
캔버스 위를 붓질로 어루만지며,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래서 그의 붉은 새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상처를 품은 모든 생명을 위한 기도이자, 다시 날아오르려는 인간의 의지다.
빨간 새는 노은님이고, 노은님은 곧 우리다.
그림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이렇게 속삭인다.
“상처도 빛이 될 수 있다.”
 |
|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현대화랑은 개관 55주년을 맞아 재독 화가 노은님(1946~2022) 특별 회고전 ‘노은님 빨간 새와 함께 With The Red Bird’ 언론공개회를 14일 서울 종로구 현대화랑에서 갖고 작가의 1980~90년대 대표작 15점을 선별해 선보이고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